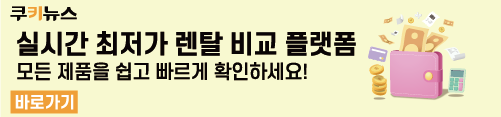다발골수종은 ‘소리 없는 암’이다. 면역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증식해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빈혈, 뼈 통증, 신장 수치 상승, 고칼슘혈증 등이 이어진다. 증상이 눈으로 보이거나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다발골수종은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제골수종연구그룹(IMWG)에 따르면 다발골수종의 완치 가능성은 약 14.3%에 그친다. 그러나 최근 조혈모세포이식 기법과 신약 개발이 진전을 보이면서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발골수종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난 1993년 기준 약 23%에 머물렀지만, 2021년에는 약 50%까지 올랐다.
조영복(78세·남)씨는 2023년 3월 단백뇨가 발견된 후 세 차례 심정지를 겪고,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많은 나이와 기저질환인 부정맥이 겹쳐 조혈모세포 이식은 적용하기 어려웠다. 1차 표준 요법인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블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 병용요법(RVd)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쿠키뉴스와 만난 조씨는 “술, 담배를 멀리 하고 골프 같은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발골수종이 찾아왔다”며 “뼈가 약해져 압박골절이 일어나 거동이 불편해졌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단 받은 해 11월부터 레블리미드 약물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 이후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 약이 나를 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초기 1차 치료제는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 환자는 나이, 동반 질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재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RVd 요법은 2019년 12월 국내에서 허가가 난 뒤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1차 표준 요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이 확대됐다.
특히 경구제인 레블리미드가 환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RVd 요법을 받으려면 24주 동안 주 2회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유지요법인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Rd) 요법은 주사제인 보르테조밉을 제외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내원하면 된다. 내원 횟수 감소는 골절이나 허약으로 인해 보호자 없이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인다.
조씨는 RVd 치료를 3개월 간 주 2회 받았으나, 울렁거림 등 불편함이 있어 기준보다 이르게 Rd 요법으로 전환했다. 조씨는 “치료가 잘 유지돼 Rd 요법으로 일찍 전환이 가능했고, 한 달에 한 번만 내원하게 됐다”며 “잦은 진료 때문에 나도, 가족들도 힘들었는데, 유지요법을 하고 나선 모두 부담을 덜었다”고 짚었다.
조씨는 환우들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조씨는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레블리미드 같은 신약을 이용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을 투약 받으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을 꾸준히 복용해 현재는 암 진행이 멈췄고 완전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 옆에서 잘 지켜준 것도 한 몫한 것 같다.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주치의인 김진석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워 여러 약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 가능한 약제 수가 적거나 부작용, 독성 문제로 장기 사용이 제한적이다”라며 “레블리미드는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 장기 투여 시에도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령 환자에선 복용 편의성을 높여 오랜 기간 치료가 가능해 재발을 늦추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다발골수종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