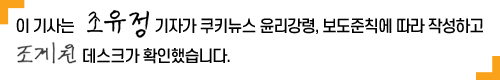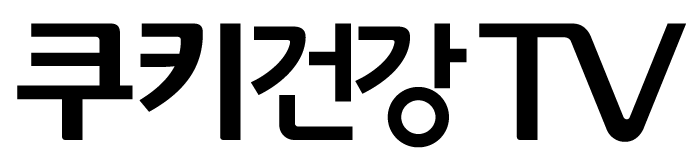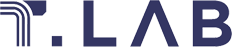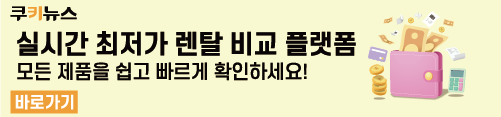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가 원자재·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기에 놓였다.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줘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도 불러온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원 오른 1425.5원으로 마감했다.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14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말 1400원대를 돌파한 이후 안착했다. 지난 9일에는 1484.1원으로 2009년 3월12일(1496.5원) 이후 16년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는 수입 자재 가격 변동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자재는 공사비의 30%를 차지한다.
실제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11월 이후 수입 자재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전년 동월비)는 지난해 11월 6.0%, 12월 9.2% 상승했다. 지난 1월과 2월도 각각 8.6%, 6.9% 상승률을 보였다. 국내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 기준)도 지난해 12월 130에서 올해 1월 131, 2월 131.04로 올랐다.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는 1339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6.50% 상승한 수준이다. 3.3㎡(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4428만4000원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연내 평균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들은 평균 원가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을 제외한 9개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원가율은 93.2%로 조사됐다. 원가율은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르는데 통상 80%대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이러한 원가율이 90%를 넘어선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각각 105.35%, 100.66%를 기록하며 비용이 매출을 넘어섰다. 이어 포스코이앤씨(94.15%), 롯데건설(93.52%), GS건설(91.33%), 대우건설(91.16%), SK에코플랜트(90.03%) 등도 90%를 넘는 원가율을 기록했다.
수익성 악화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진다. 각 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올해 매출 목표치를 15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액(18조6550억원)대비 2조7550억원(14.8%) 낮은 금액이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매출 32조6944억원에서 올해는 2조3107억원(7.1%) 감소한 30조3837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10조5036억원)대비 2조원 줄어든 8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같은 기간 DL이앤씨는 5184억원(6.2%), GS건설은 2638억원(2.1%) 적은 금액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경기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 짚었다. 그는 “건설자재는 공사비의 30%를 차지한다”며 “자재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져 건설공사원가상승, 현장 지연 등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은 수입재 중심의 원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낮으나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의 2차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산업의 비용 상승이 원자재 등에 간접적으로 전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건설비용 전반에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수입산 자잿값이 인상되면 공사비 상승과 원가율 상승,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체제가 없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며 “대체 수입국 발굴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전략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