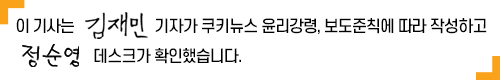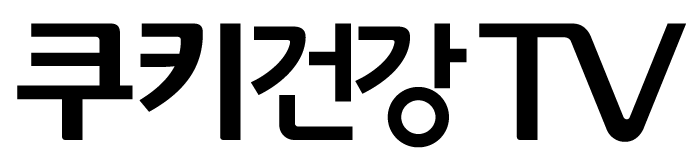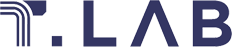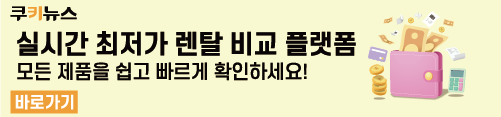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요국을 대상으로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대만 등이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번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행보에 따라 사업 참여 범위 등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던리비 주지사는 이틀 일정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통상·에너지 당국자와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하고, SK이노베이션 E&S,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에너지·자원개발회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 참여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에너지 협력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건설을 포함해 총 투자비는 440억달러(약 64조원)로 추산된다.
프로젝트 자체로만 보면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 및 수급 안정을 꾀하고, 국내 에너지 분야 기업뿐만 아니라 철강·조선·건설 기업들이 플랜트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동맹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관세 면제 등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이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선 미 에너지부의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는다. 총 투자비가 한국 연간 예산의 10%에 육박할 만큼 부담이 상당한 데다, 알래스카의 혹독한 기후 환경을 고려하면 향후 건설·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1960년대부터 알래스카 북부의 대규모 석유·천연가스 유전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1년 중 절반이 땅이 얼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오랜 기간 실익을 얻지 못했다. 엑손모빌 등 오일 메이저 기업 역시 해당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을 뗀 상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실 사업성이 높았다면 이미 미국의 자국 기업들이 참여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을 것”이라며 “통상환경의 영향으로 프로젝트 참여는 불가피할 전망이나, 민간기업 참여 범위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신중론을 펼치는 사이 대만은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지난 20일 대만 국영 석유기업인 대만중유공사(CPC)는 대만 타이베이 본사에서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와 LNG 구매·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LOI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식 계약에 이르도록 서로 협력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업의 경제적 이익보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우선순위로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일본도 해당 프로젝트 참여에 긍정적 의사를 표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투자 참여를 콕 집어 언급했으므로, 던리비 주지사는 이번 방한 일정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기정사실화’를 확정지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친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일정에 맞춰 현지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협의해보고, 한국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