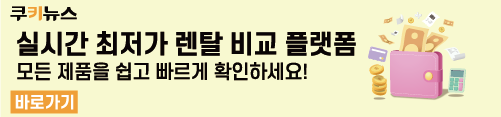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 사회도 ‘비혼 출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혼 가족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혼인 중심 정책’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했다.
발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통계청의 지난해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37.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4.7%로 OECD 26개국 평균(41.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은 자녀 출생 시부터 부모가 법률혼 관계인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한다.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아이에게 ‘혼인외 출생자’라는 낙인을 찍도록 한 것은 매우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결혼 비의향자 중에서도 출산 의향이 있는 인구층의 존재를 조명했다. 손 팀장은 “이혼·별거 증가 등으로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는 성인 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를 갖기 위해 법적 결혼 상태를 충족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부부로서가 아닌 개별 남녀의 독립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비혼 출산 장려 정책 방향은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비혼 출산의 정당성과 방향을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춰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재생산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혼 출산 가정이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