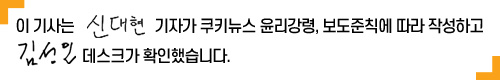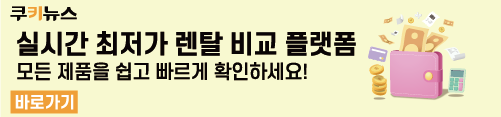# 콩팥 기능이 약화돼 2023년 12월 뇌사 장기 기증을 받은 김인호(65·가명)씨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했지만 몸을 돌보지 않았다. 김씨가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땐 이식받은 콩팥의 기능이 다시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은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계해 김씨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고, 김씨는 기증이 헛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김씨의 주치의인 박연호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장기 이식은 한 사람의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년간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다.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많은 이들이 장기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기증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3년 2907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8명꼴이다. 반면 뇌사자 장기 기증 건수는 48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엔 397명으로 17.8%가 줄었다. 기증자가 4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2011년 368명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만2990명이던 대기자는 2023년 4만3421명으로 5년 새 1.3배 증가했다. 대기 기간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 기준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평균 2802일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은 본인이 장기 기증을 희망하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옵트인(opt-in)’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 영국 등은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기증 대상자로 보며, 기증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KONOS에 따르면 스페인은 2022년 인구 100만 명당 46.03명의 장기 기증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같은 해 7.88명에 그쳤다.
황정기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장(혈관이식외과 교수)은 “생체 장기 기증(가족 간 기증) 건수는 세계에서 1~2위를 다투지만, 뇌사 기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미국처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기증 희망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면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졌을 때 가족들의 기증 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CD)’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DCD는 사전 동의에 따라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 뒤 전신의 혈액 순환이 멈췄을 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 기증 과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스페인 등은 전체 기증의 3분의 1 이상이 DCD를 통해 이뤄진다.
박 센터장은 “심장이 멎고 난 이후에도 콩팥은 최대 12시간 이내, 간은 2시간 이내에 적출하면 충분히 이식할 수 있다”면서 “DCD 제도를 도입하면 기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기증 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의 인식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태현 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이사는 “기증 유가족은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기증했냐’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곤 한다. 기증을 나눔이 아닌 교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숭고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유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