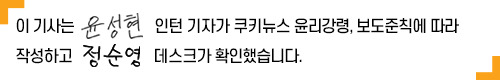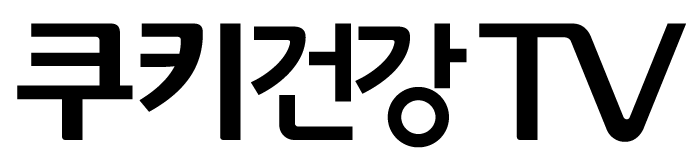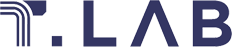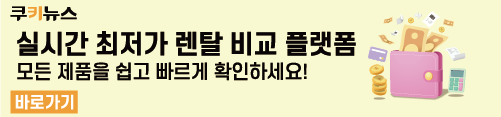스포티파이가 지난해 10월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를 내놓은 이후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국산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계약상 ‘역차별’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11일 앱 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는 전월(37만명) 대비 198% 증가한 109만명을 기록했다.
스포티파이가 2021년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프리’ 요금제가 없었다. 한국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및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의 저작권료 협상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스포티파이가 음저협 등 유관 단체들과 새로운 저작권료 계약을 맺으며 ‘스포티파이 프리’가 도입돼 극적으로 저작권료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스포티파이의 저작권료 계약에 음저협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 기업에서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밀크뮤직’을 출시하며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2017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시 음저협은 멜론 등 월정액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에 곡당 3.6원의 저작권료를 책정했지만, 무료 요금제에는 곡당 7.2원을 징수했다.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에 대한 별도 징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 것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스포티파이의 계약에 음저협의 차별이 있었다고 말이 돌고 있다”며, “과거 ‘밀크뮤직’의 사례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준수해 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징수 규정 가이드라인보다도 저렴한 금액에 저작권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문체부와 유관협회가 갱신하는 징수규정은 가이드라인일 뿐 준수의무는 없어 국내 플랫폼들만 이를 지켜왔다”며 “실제로 유튜브, 애플뮤직 등 해외 플랫폼은 대부분 권리자 단체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저협이 해외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기존 징수규정과 다른)계약을 맺은 것 같다”며 “음저협은 국내 음악 저작권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 플랫폼이 직접 불만을 표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음저협은 이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자세한 저작권료 계약 사항은 비밀 유지 사항이라 밝히지 못하지만 이번 스포티파이 계약 건 역시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음저협 관계자는 “형평성과 관련된 오해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소통하거나,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석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어떠한 차별이나 차등을 두지 않고 서비스의 형태 및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두고 징수규정에 따라 계약하고 있다”며 “현행 징수규정은 저작권법, 그리고 정부로부터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료 징수 주체인 함저협은 “결국 (스포티파이가)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약이 체결됐다”며 “국내사업자들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음저협 등 유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징수규정을 문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며, “문체부에서는 유관협회와 사업자 간 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스포티파이 계약 역시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신탁단체와 사업자간의 계약은 상호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일일히 밝힐 수 없어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탁과정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12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나머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해 저작권 관리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