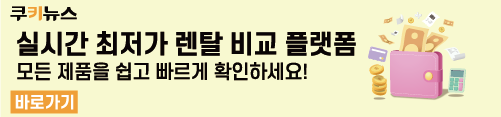“하루는 딸아이가 ‘상모 돌리기’가 뭐냐고 묻더군요. 서현이(가명)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흔드는 틱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본 친구가 ‘상모 돌리는 것 같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뜬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을 아울러 ‘틱 장애’라고 한다.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전체 유병기간이 1년을 넘으면 ‘투렛 증후군’이라 부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투렛 증후군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9세 이하 어린이는 지난 5년(2016~2020년) 동안 연평균 5.9%씩 늘었다. 2020년에는 2388명이 투렛 증후군 진료를 받았다. 의료기관을 찾진 않았지만 틱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내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쿠키뉴스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김성주 아주대병원 교수 △김은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안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가나다 순)에게 대신 물었다.
발병 원인 다양…대부분 1년 안에 증상 사라져
아동 틱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학령기 아동의 20% 이상이 일시적으로 틱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가 있다. 첫 증상은 보통 만 4~7세 사이에 나타난다.
틱 장애(투렛 증후군)는 왜 나타날까.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다만 3명의 의사들은 유전적 요인을 꼽았다. 안재은 교수는 “환아의 직계 가족에서 틱 유병률은 2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53~56%, 이란성 쌍둥이는 8% 정도 일치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틱 장애는 환경적 요인, 임신 및 출산 전후 기간의 문제, 면역학적 요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상, 뇌 기능 이상 등과 관련 있다는 연구도 있다.
전문가들은 80~90%에 달하는 대부분의 틱은 어릴 때 뇌 발달 과정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1년 이내에 사라지는 ‘일과성’이라고 말한다. 운동 틱,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10~12세를 정점으로 점차 호전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경과를 지켜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은주 교수는 “부모들이 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큰일’로 받아들인다”면서 “그래서 스트레스나 긴장이 심해지면 일시적으로 틱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부모가 너무 불안해하면 아이가 증상을 숨기다 병을 키울 수도 있다. 틱 증상을 ‘딸꾹질’처럼 여겨야 한다.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지만 ‘이럴 땐’ 병원 가야
틱 장애 증상은 순서가 있다. 보통 처음에는 눈 깜박임, 코 씰룩임, 얼굴 찡그림 등 얼굴에서 시작한다. 이후 목, 어깨, 팔, 몸통, 등, 다리 등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고개를 갑자기 젖히기, 어깨 들썩임, 배 근육에 갑자기 힘주기, 다리 차기 등이다. 여기에 기침 소리, 코 킁킁 거리는 소리, 목을 긁는 소리, 동물 울음소리, 욕설, 외설 등 음성틱이 더해지기도 한다.
김성주 교수는 “얼굴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운동틱은 치료받지 않아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목 아래 신체에서 발생한 운동틱은 좀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만성 틱 장애 아동에게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강박 장애가 진단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전반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아이가 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했다. 서현이 아빠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쳐다볼 때가 있는데 알고보니 내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너무 창피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병원을 찾았다.
김은주 교수는 틱 장애가 유전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인 만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어릴 때 틱이 있었다면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오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가 덜해지는 주기가 짧아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
1년 이상 만성 틱 장애 아동은 질병에 대한 교육, 습관 역전 훈련, 인지행동치료 등을 할 수 있다.
김은주 교수는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만 10세가 넘어가면 ‘내가 곧 틱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캐치한다. 이를 전조 충동이라 한다. 전조 충동을 인지하면 곧바로 하게 될 틱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질병 교육의 경우 부모도 함께 받도록 권유했다.
증상이 심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어린이 틱 장애 치료에는 아리피프라졸(제품명 ‘아빌리파이’ 등), 리스페리돈(제품명 ‘리스페달’ 등)을 흔하게 사용한다. 약을 먹는다고 증상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증상의 강도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병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리피프라졸과 리스페리돈은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항정신병약물이다. 김은주 교수는 “‘우리 애한테 왜 조현병 약을 줬냐’며 놀라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뇌 기전 상 틱 장애는 도파민 쪽 신경전달물질 체계 이상이라고 본다”면서 “(신경전달물질이) 과잉 활성화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는 약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틱 장애에 사용하는 약은 소아에게도 안전하다고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공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현병 치료 등과 비교해 소량의 약물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리피프라졸과 리스페리돈 모두 졸림, 수면 장애,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또한 틱이 심해지거나 아이가 성장해 덩치가 커지면 약물 용량이 올라가는데, 그러다보면 간혹 움직임이 뻣뻣하고 느려지는 추체외로증후군, 가만히 있지 못 하고 안절부절하는 정좌불능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약은 얼마 동안 먹어야 할까. 안재은 교수는 “주기적으로 증상을 재평가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한다”면서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서 틱증상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만큼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