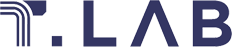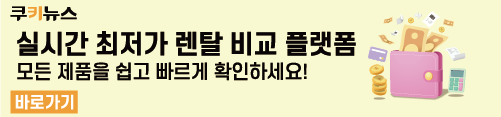[쿠키 사회] 회사원 장모(35)씨는 지난 14일 저녁만 생각하면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장씨는 이날 오후 7시쯤 더위를 식힐 겸 서울 마포대교를 걸어서 퇴근하고 있었다. 마포대교 인도엔 자전거와 보행자 길을 구분하는 선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장씨는 보행자 길을 따라 걷다가 순간 왼쪽 팔에 통증을 느꼈다. 묵직한 쇳덩이가 빠른 속도로 장씨의 팔꿈치를 치고 지나간 것이다. 자전거였다.
하지만 장씨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보행자 도로 위를 유유히 달리며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자전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장씨는 타박상 입은 팔보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자전거 운전자의 양심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전거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애매한 규정이 뺑소니 사고 불러=그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차마(車馬)’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의 지위는 달라졌다. ‘인도’로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인도 가장자리 구역’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인도 전체로 다닐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자전거 운전자의 인식을 느슨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한다고 나섰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현재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의 73%가 인도에 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자연히 사고도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3건이던 자전거-보행자 사고는 2010년 224건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자전거 이용자들도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애물단지’ 신세가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자동차에 준해 받기 때문이다. 정모(32)씨는 지난해 6월 자전거를 몰다 김모(28·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러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들은 늘 뺑소니 유혹에 빠진다. 자전거로 매일 출퇴근한다는 회사원 김시온(26)씨는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달리다 보니 밤이 되면 사고를 종종 볼 수 있었다”며 “사고가 나면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외치고 가버린다”고 말했다.
자전거 뺑소니 사고가 빈발하자 각 자전거 동호회들이 나서서 회원들에게 보행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트위터러 @oos**는 “사고가 나면 꼭 연락처를 주시고 병원으로 모시지 않으면 뺑소니”라며 “차량처럼 번호가 없다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뺑소니 줄일 방법 없어=문제는 자전거 뺑소니를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도망가면 그만이다.
서울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은 “자전거-보행자 사고는 신고 건수 자체가 적은데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라며 “자칫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의견에 공감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뺑소니는 번호판,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이런 자료가 없을 때가 많아서 잡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전거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연을 올렸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자전거에 부딪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되레 “자전거가 오는데 왜 피하지 않았냐”며 큰 소리를 친 뒤 아이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가 버렸다.
결국 이 네티즌은 아들과 병원에 다녀온 뒤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엔 CCTV가 없었다. 아들은 자전거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다. 해당 경찰은 자전거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굳이 신고하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 이 네티즌은 “경찰이 못 잡더라도 자신이 마을을 뒤져서라도 찾겠다”며 글을 마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도·차도와 구별되는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회사원 박용태(28)씨는 “현재 상황이라면 자전거는 차도에서든 인도에서든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를 늘려 사고를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하지만 장씨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보행자 도로 위를 유유히 달리며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자전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장씨는 타박상 입은 팔보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자전거 운전자의 양심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전거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애매한 규정이 뺑소니 사고 불러=그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차마(車馬)’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의 지위는 달라졌다. ‘인도’로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인도 가장자리 구역’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인도 전체로 다닐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자전거 운전자의 인식을 느슨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한다고 나섰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현재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의 73%가 인도에 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자연히 사고도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3건이던 자전거-보행자 사고는 2010년 224건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자전거 이용자들도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애물단지’ 신세가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자동차에 준해 받기 때문이다. 정모(32)씨는 지난해 6월 자전거를 몰다 김모(28·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러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들은 늘 뺑소니 유혹에 빠진다. 자전거로 매일 출퇴근한다는 회사원 김시온(26)씨는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달리다 보니 밤이 되면 사고를 종종 볼 수 있었다”며 “사고가 나면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외치고 가버린다”고 말했다.
자전거 뺑소니 사고가 빈발하자 각 자전거 동호회들이 나서서 회원들에게 보행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트위터러 @oos**는 “사고가 나면 꼭 연락처를 주시고 병원으로 모시지 않으면 뺑소니”라며 “차량처럼 번호가 없다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뺑소니 줄일 방법 없어=문제는 자전거 뺑소니를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도망가면 그만이다.
서울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은 “자전거-보행자 사고는 신고 건수 자체가 적은데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라며 “자칫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의견에 공감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뺑소니는 번호판,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이런 자료가 없을 때가 많아서 잡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전거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연을 올렸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자전거에 부딪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되레 “자전거가 오는데 왜 피하지 않았냐”며 큰 소리를 친 뒤 아이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가 버렸다.
결국 이 네티즌은 아들과 병원에 다녀온 뒤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엔 CCTV가 없었다. 아들은 자전거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다. 해당 경찰은 자전거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굳이 신고하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 이 네티즌은 “경찰이 못 잡더라도 자신이 마을을 뒤져서라도 찾겠다”며 글을 마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도·차도와 구별되는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회사원 박용태(28)씨는 “현재 상황이라면 자전거는 차도에서든 인도에서든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를 늘려 사고를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