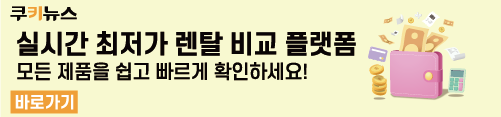소비자가 ‘초고가 명품’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명품 가방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구매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품업계 전반의 실적 역시 이를 반영하듯 하락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지난해 매출이 187억달러(약 25조7000억원)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5억달러(약 6조2700억원)로 30.0% 줄었다.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이 제한됐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지난해 매출 846억유로(약 132조9000억원), 영업이익 195억유로(약 30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2.0%, 14.0% 감소한 수치다. 케링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172억유로(약 27조원), 26억 유로(약 4조800억원)로, 전년 대비 12.0%, 46.0% 줄어들었다.
에르메스는 예외적으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에르메스의 2분기 매출은 3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업계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에르메스는 초고가 전략을 유지하며 일본, 유럽, 미국 등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들 사이에선 과거처럼 꼭 사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선 명품관 앞을 둘러보기만 하다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백화점을 방문한 30대 여성 강모(39·여)씨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며 “예전에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A씨(34) 역시 “2~3년에 한 번씩 명품 가방을 사거나 신상품이 나오면 관심이 생기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가격만 올리는 느낌이라 매력을 못 느낀다. 리셀가도 많이 하락해 희소성이 예전 같지 않다”며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처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방의 한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7년째 근무 중인 판매사원 손모(36)씨는 “예전보다 20~30대 고객 비중이 줄었고, 부모님 선물을 고르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매장 직원은 “한동안 인기 있던 브랜드 신상품도 생각보다 회전율이 느리다. 고객들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한편, 중고 리셀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때 웃돈이 붙어 거래되던 고가 제품들의 프리미엄이 빠지며, 가격 상승 기대감 자체가 약해졌다는 평가다. 팬데믹 당시 품귀 현상으로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던 샤넬의 대표 제품들이 신품 대비 중고 거래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리셀 플랫폼 크림에 따르면 샤넬의 ‘클래식 스몰 플랩백’은 현재 1200만~13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450만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1년 새 200만원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중고가가 매장 정가(1497만원)보다 낮아진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미니 쇼핑백’은 880만원에서 703만원으로, ‘가브리엘 스몰 호보백’은 87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리셀가가 떨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가 가방보다 실물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가 더해진 주얼리로 소비자의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도 포착된다. 까르띠에 등을 보유한 리치몬트는 지난해 2분기 주얼리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주요 브랜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했지만,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도 높아졌다”며 “과거처럼 로고나 상징성만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소성은 명품의 본질이었지만, 반복적인 디자인과 과잉 유통, 높은 리셀가 붕괴 등으로 ‘가지고 싶다’는 감정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며 “지금의 매출 하락은 단기적 조정이라기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명품의 정의가 재편되는 구조적 신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