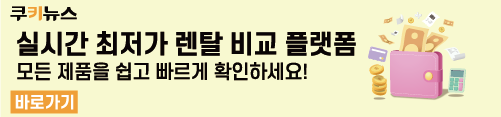7년 전, 지난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사는 이상주씨는 울고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 아흔넷. 한 세기 가까이 산 이도 잊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다.
이씨의 삶은 일본에 끌려갔던 열일곱 시절에 멈춰있었다. 1940년, 보령 군청 노무계 직원들이 차출 명단을 들고 이씨 앞에 섰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술을 배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것이 권유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그는 일본으로 끌려갔다. “네가 가지 않으면 네 형이라도 붙잡아 가겠다”는 위협 때문이었다.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간 이씨는 광산과 제철소를 오가며 일했다. 광석을 채굴하고, 철을 만들었다. 소년이 하기에는 가혹한 일이었다. 그렇게 일해서 받은 돈이 7원. 한 달을 울면서 일해야 제철소 근처 팥죽집에서 5원짜리 팥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
많은 조선인이 죽었다. 이씨는 죽음을 지켜보며 또 일해야 했다. 고향이 그리웠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는 일본으로 끌려오기 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던 부모님의 얼굴을 매일 상상했다고 했다. 그러니 가족이 그리울 땐 눈을 감는 수밖에 없었다고.
2017년 4월. 당시 기획취재팀에 있었던 나는 팀원들과 함께 강제동원 취재를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났다. 이씨는 그때 만난 취재원 중 한 명이다. 앙상했던 몸, 힘겹게 뱉던 숨을 지금도 기억한다.
기자들은 취재할 때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앞에 앉은 이가 피해자여도 마찬가지다. 강제동원 취재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다. 이씨가 일본인 상관에게 맞아 청력을 잃은 상황을 설명할 때가 그랬고, 숱한 밤 쪼그려 누워 고향 방향을 가늠했다는 이야기할 때도 그랬다. 아흔이 넘은 피해자들이 눈물과 서러움을 쏟아내는 상황은 반복해도 무뎌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7년 전 그날에도 나를 비롯한 기자들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강제동원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썼다. 피해자들은 사과받지 못했고, 일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러 광복 후 79년이 지났다.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하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내놨다.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전시 공간엔 강제동원 표현이 빠졌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인사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씨는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났다. 좋은 기사를 써서 피해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일본과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죄송한 마음뿐이다.